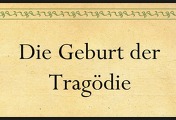인간은 감정의 산물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뿐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몸짓, 혹은 자신만의 고유한 분위기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어떤 기운을 내뿜는다. 인간은 자신들만의 재능을 이용해 문화를 일구면서 위의 것들을 확장시켰다. 그로인해 생긴 다양한 감정 표현의 대체물들을 우린, 그림, 조각, 음악, 영화, 오페라 등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거기에 매체라는 전달방식이 가세해 셀 수 없이 많은 조합이 가능해졌다. 지금도 이 감정 표현의 대체물들은 다양한 문화적 혹은 기술적 장치들과 결합하면서 계속 분화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 음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반영한다. 물론 정말 그런지는 모른다. 그것은 물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로 빠진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못 박을 수 없다. 연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음악은 '글'이 작곡가의 생각을 표현해 준다. 이를 표제라 한다. 즉, 제목이나 주제가 그 음악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글이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백인백색일 것이다. 그 곡이 주는 진짜 의미는 모르고 저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읽으려 할 것이다. 암튼 우린 그 음악이 진짜로 어떤 감정을 의도하는 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표제가 주어진 경우, 예를 들어 명확한 제목과 가사로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런 주체의 생각을 받는 객체가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글을 똑같이,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같은 글이라도 수용자의 태도와 경험, 이해력, 사고력 등으로 완전 다른 의미가 된다. 하지만 암튼 글이라도 있으면,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작자의 의도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음악을 사랑이나 기타 여러 감정의 표현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악 자체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령 우리는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로 대표되는 무조음악을 불안하게 느끼고 3도 화음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느끼지만 바로크 이전만 해도 3도를 불안정하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음악 역시도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일 뿐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의 음악 평론가 에두아르드 한슬리크(Eduard Hanslick)는 절대음악을 옹호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와 같이 절대음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표제가 음악의 해석을 한계지우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리고 음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세계의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그렇게 가지는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강력한 회의가 든다. 그렇다 절대음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음악은 표제로 전하려는 메시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음의 나열일뿐이다. 그러니까 표제로 한계를 만들고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넓은 감상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I. Kant)의 표현을 들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안경을 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석을 무한으로 한다한들 결코 물자체로 다가서지 못한다. 행여 맞다하더라도 다가서는지조차로 모를 것이다. 우리는 음악을 표제에 싣어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아마 절대음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특정한 음악이 주는 인상은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감정을 넘어선 어떤 것도 지각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모차르트(W. A. Mozart)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아무런 표제 없이 즐기거나 그 음악이 너무 좋아 계속 끼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이 왜 나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말한다고, 인간은 그걸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혹은 그 걸 좋아하도록 만드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절대음악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정을 배제한 음악을 느낄 수는 없으며 더더욱이 그것이 이 지상의 세계를 넘어 어떤 절대자의 세계를 암시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런 논리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음악에 표제를 넣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지극히 우리가 느끼는 한도 내에서만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 혹은 신(神)이 있다면 인간의 데시빌(dB)과 같을까를 고민해 보게 된다.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아마도 위대한 신은 (진공상태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찬미한 '천사도 감동한 모차르트'와 같은 카피는 정말 헛소리일 수 있다.(물론 철학적 정당성을 떠난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그 과장법은 당연하게도 인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개미나 거미, 미생물들이 즐기는 음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암튼 음악은 우리의 오감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뒤샹(M Duchamp)의 샘(Fontaine)에 비견되는 전위 예술가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4' 33'')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이 곡은 세상의 그 무엇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임을 잘 보여준다.
20080830 현지운 rainysunshine@tistor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50s/1952] - 4‘ 33’‘ - John Cage
후원을 하시려면
'음악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리의 물리적 특성 (0) | 2019.04.10 |
|---|---|
| 아폴론 vs 디오니소스 (0) | 2012.01.10 |
| 식물에도 감정이 있을까? (0) | 2011.12.28 |
| 음악은 대상이 없다 (1) | 2011.12.25 |
| 사적관심 vs 공익적 관점 (0) | 2011.12.23 |